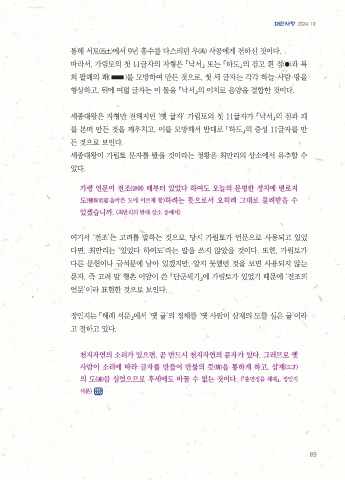Page 89 - 월간 대한사랑_10월
P. 89
2024. 10
통해 서토(西土)에서 9년 홍수를 다스리던 우(禹) 사공에게 전하신 것이다.
따라서, 가림토의 첫 11글자의 자형은 「낙서」 또는 「하도」의 검고 흰 점(●)과 복
희 팔괘의 괘( )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첫 세 글자는 각각 하늘·사람·땅을
형상하고, 뒤에 여덟 글자는 이 둘을 「낙서」의 이치로 음양을 결합한 것이다.
세종대왕은 자형만 전해지던 ‘옛 글자’ 가림토의 첫 11글자가 「낙서」의 점과 괘
를 본떠 만든 것을 깨우치고, 이를 모방해서 반대로 「하도」의 중성 11글자를 만
든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왕이 가림토 문자를 봤을 것이라는 정황은 최만리의 상소에서 유추할 수
있다.
가령 언문이 전조(前朝)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변로지
도(變魯至道:올바른 도에 이르게 함)하려는 뜻으로서 오히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만리의 반대 상소 중에서)
여기서 ‘전조’는 고려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가림토가 언문으로 사용되고 있었
다면, 최만리는 ‘있었다 하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가림토가
다른 문헌이나 금석문에 남아 있겠지만, 알지 못했던 것을 보면 사용되지 않는
문자, 즉 고려 말 행촌 이암이 쓴 「단군세기」에 가림토가 있었기 때문에 ‘전조의
언문’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인지는 「해례 서문」에서 ‘옛 글’의 정체를 ‘옛 사람이 삼재의 도를 실은 글’이라
고 전하고 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곧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情)을 통하게 하고, 삼재(三才)
의 도(道)를 실었으므로 후세에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
서문)
89